K마트 몰락의 교훈…뷰티서플라이 ‘대형화’ 꿈꾼다면
올해 4월 K마트는 뉴저지 애비넬에 위치한 한 곳의 지점을 더 폐쇄하면서 전국에 3곳의 매장만을 남겨두게 됐다. 미국을 대표하는 할인 유통 체인점이었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K마트는 한때 미국 전역에 2440개 매장, 3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미시간 가든 시티에 첫 매장을 오픈한 후 같은 해에만 17개 지점을 확장했고 단 4년 만에 162개점포로 확장했다. 1970년대에는 “K마트는 매주 새 지점을 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1995년까지 이 급진적인 성장세는 지속됐다. 1995년 기준 K마트 매장은 2,000곳이었다. 95%의 미국인이 K마트 매장에서 15마일 이내 거리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나오기도 했다. 당시 K마트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회사였고 Sports Authority, Office Max 등을 연달아 인수하며 규모를 키워 나갔다. 같은 시기 문을 연 월마트는 1990년까지 1,721곳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K마트는 이보다 훨씬 많은2,330개 지점을 운영했다. 그렇게 성장가도를 달리던 회사는 2002년 파산 챕터 11을 신청하며 충격을 안겼다.

올해 4월 폐점한 뉴지저 애비넬 점 ©Linda Moss/Costar
대규모 매장, 다양한 물건,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던 K마트, 특히 마샤 스튜어트 리빙(Martha stewart living)과 디즈니키즈 어패럴(Disney kids apparel) 등으로 마니아 층을 형성하기도 했고 매장에서 갑자기 파란 불빛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알리던 깜짝 세일 ‘Blue light special’은 쇼핑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흐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던 K마트는 비슷한 유통 체인인 월마트와 타깃 스토어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올해 4월 K마트 뉴저지 애비넬점 폐점 소식이 전해진 후 한 커뮤니티에는 K마트의 향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너도 나도 이곳을 ‘추억의 장소’라고 칭했다. 하지만 이들의 말속에서 분명한 쇠락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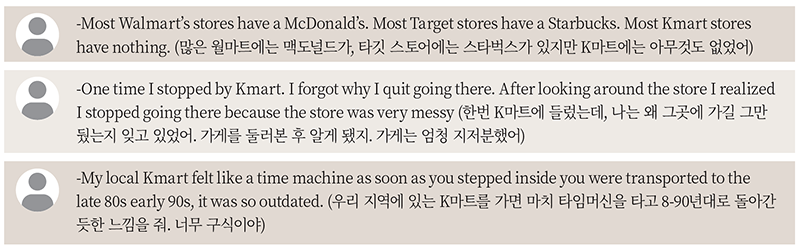
워싱턴 포스트는 K마트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겨냥하지 못했고 품목별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커뮤니티에 모인 과거 소비자들의 말속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한매장, 뭔가 구식인 듯한 점포 분위기, 부족한 부대시설 등은 쇼핑객들의 ‘경험’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했다.
8-90년대에 미국에 왔던 이민자들에게도 K마트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소였다. 80년대 후반 한국에서가족들과 함께 메릴랜드로 이주한 김 씨(당시 13세)는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k마트를 찾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랬던그가 K마트를 찾지 않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준 점퍼가 작은 나뭇가지에 무참히 찢어져 버려 입지 못하게 된 때부터였다. 김 씨는 “K마트라는 곳이 본래 저렴한 물건들을 주로 팔았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퀄리티 제품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래도그 작고 얇은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옷 전체의 올이 풀려버린 것은 제게 좀 황당한 일이었죠” 학교 아이들 사이에도 K마트를 화두로 한 농담들이 번지기 시작했다. 학교버스를 타고 K마트 인근을 지날 때마다 짓궃은 친구들은 “넌 평생 K마트에서 물건이나사서 쓰라”고 핀잔 어린 말들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친구들의 그런 언사 속에서 K마트에 대한 점차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쌓였고,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 가길 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깔끔한 월마트 매장 내부 ©shutterstock

타깃 스토어의 패션 디자이너 협업 시리즈 ©Kelly Tyko, usatoday
그렇게 K마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고 같은 시기 시장에 뛰어들었던 월마트와 타깃 스토어는 성장을 지속해 나갔다. 월마트는 시골 지역부터 집중 성장을 지속했고 상품 하나하나에 바코드를 붙여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 맘앤팝 스토어(mom-and-pop stores)와 협업했고 체계적인 배송 체계를 갖춰 가격은 낮게 유지하면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창고형 할인 매장 샘스클럽을 만들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까지 사로잡았다. 매일 최저가(Every Day Low Price)라는 전략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월마트의 제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백화점 수준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시장에 나선 타깃 스토어는 ‘Expect More, Pay Less’ 슬로건을 내세웠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제품들을 내놓았고 깔끔한 매장과 친절한 서비스로 인기를 얻었다.

K마트와 시어즈의 합병 ©spectrumnews1
결국 타깃 스토어가 발 빠르게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월마트가 대규모 슈퍼센터 등 사업 다각화와 좀 더 저렴한 물건을내놓기 위해 노력할 때, 경쟁에서 뒤처진 K마트는 “갈 이유가 없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헤지펀드 투자자 에드워드 램퍼트가 구원투수로 나서며 백화점 체인 시어스와 합병을 했던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던 합병은 K마트의 회생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CNBC는 “K마트의 쇼핑객은 시어즈의 도구(tools)에 관심이 없었고 시어즈의 쇼핑객은 K마트의 생필품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통점이 없는 두 곳의 한 집 살이는 결국 시어즈와 K마트 둘 다 나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뷰티서플라이 업계도 대형화에 나서는 추세인 요즘, 지역에 여러 점포를 넘어 타주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체인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K마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저 대규모 매장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점차더 똑똑해지고 더욱 빠르게 소비 패턴을 바꾼다. 트렌드에 조금만 뒤처져도 발길은 금방 끊어지기 마련이다. 매장에 들어섰을 때고객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쇼핑을 하면서 필요한 안락한 경험에도 반드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많은 뷰티서플라이의 구글 리뷰를 읽어보면 대체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이 다시는 그 매장을 찾지 않는계기가 될 수 있다. 흑인 여성 고객들이 많은 뷰티서플라이, 항상 이들의 관심사와 유행을 주목해야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고객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체인 스토어라면 더욱 지역적 특징과 소비 패턴을 잘 읽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